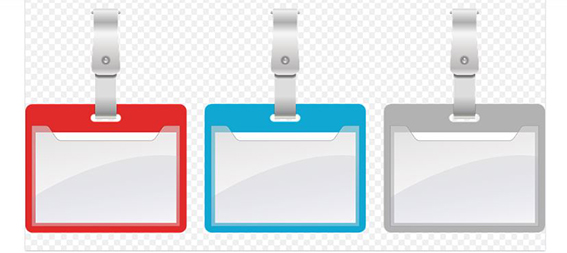
최기훈 장로(수필가, 한국)
아버지는 내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았다.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시면 쇠죽을 끓여 놓고 논배미 서너 곳을 둘러 보았다. 그치지 않고 논둑에 무성한 풀을 베어 외양간 앞에 한 짐 쇠꼴 지게를 받쳐 놓았다. 나는 그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윽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기훈아, 여태 자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과 지극한 애정이 스며 있었다.
잠을 깨우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도 이제는 들을 수 없다. 생각할수록 그리운 아버지다. 동네 어른들은 아버지 앞에 맏이인 내 이름을 꼭 넣어 불렀다. ‘기훈이 아버지!’라고. 하긴 집집마다 그 집 큰 애 이름을 어른 이름 앞에 붙이는 게 고유명사처럼 된 것이다.
내 이름은 그렇게 퍼져 나갔다. 참 소중한 이름이다. 내 휴대폰에는 고향 집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다. 그런데 어머니로 표시하지 않았고 그냥 어머니의 성함을 썼다. 함정완(咸鋌梡)이라고. 그렇게라도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은 아들의 진정한 마음일 터다.
아내는 이따금 반색하며 내 이름을 부른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진지한 표정이다. 생각해 보니 중요한 말을 꺼낼 때, 또 내 허물을 발견하고 정중히 지적할 때 쓰는 어투다. 최기훈 씨! 아내가 이렇게 부르면 나는 사뭇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름에는 내 얼굴과 마음과 행동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아주 친근한 직장 선배가 있었다. 술 좋아하는 그 선배의 억양은 참 부드럽고 따뜻했다. 더구나 그는 나를 부를 때 직급에 따르는 보편적인 호칭을 쓰지 않았다. 그냥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그의 그런 ‘부름’이 왠지 좋았다. 투박한 제복 관료제 가운데 인간적인 따뜻함을 내내 잊지 못하는 것이다. 술을 못 하는 나였지만 그 선배에게만큼은 ‘네, 형님’이라고 맞장구치며 술 한 잔 사주고 싶을 정도였다. 애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속에 그의 따뜻한 인품이 느껴졌다.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은 참 특별한 직장 공동체이다. 벌써 십 년 세월이 훌쩍 지났다. 입사 당시 거의 결혼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이제 식솔을 거느린 어엿한 가장(家長)이 되었다. 나는 틈틈이 자녀의 이름을 묻고 기억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기억하는 예쁜 그 이름들을 불러 본다. 수현, 도현, 시영, 시은, 민성, 수진, 준혁, 준호, 강준, 강윤, 이든, 이엘, 가온, 나온, 인서, 아인, 하율, 온서, 선윤, 나윤, 동건, 로은, 재하 그리고 우리 손주 시은, 라은, 건 …….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는 어느 수용자에게 물었다. 소망교도소에서 가장 좋은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잠깐 생각하는 듯하더니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예, 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마디 더했다.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이렇게 짙은 감동을 줄 줄이야. 하긴 현행 법규는 수용자의 번호를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름을 불러도 어긋나지 않는 여백처럼 느껴지는 넉넉한 규정도 있다.
자주 이름을 불러 줘야겠다. 이왕이면 이름 앞에 애틋한 수식어를 붙여 보자. ‘사랑하는 ㄱㄴㄷ 씨!’로 부르면 그 마음까지 바투 다가온다. 가늘면서 쉰 소리가 나는 내 말씨 흉내를 잘 내는 직원이 있다. 그와 함께한 지도 십 년이 넘었으니 그는 내 표정과 말투며 속속들이 꿰 뚫어본다.
그가 사랑스럽다. 그의 익살은 가히 수준급이다. 어쩌면 우리 조직에서 그의 익살스러운 재담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 ㄱㄷ 씨는 자신이 우리 직장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인 줄 아는가 모르겠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달리 명시가 아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월간 「矯正」 22.08)

